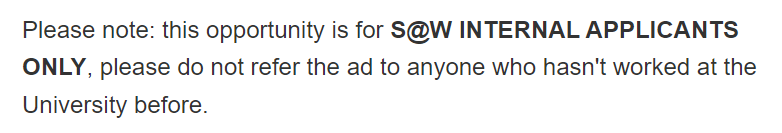호주의 박사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가 드물어, 시작부터 졸업까지 진행되는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보았습니다. 멜번대, 풀타임 유학생 박사과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며, 다른 호주 학교들과 큰 차이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유학생은 비자 기한의 문제로, 파트타임을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1. Commencement
박사 과정의 시작입니다.
2. Pre-confirmation Seminar
Commencement로부터 6개월 전후로 Supervisory Group과 함께 연구 경과 공유와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또한 이시기를 전후로 Supervisory Group 인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만, 최대 1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시스템과 다른 부분이라 어색하실 수 있는 부분이 Supervisory Group입니다. 지도교수의 역할을 하지만, 주도하는 1인 (Principal Supervisor)과 보조하는 다수 (1인부터 3~4인; Supervisor)가 팀을 구성하여 학생의 박사 연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Supervisory Group입니다. 저의 경우 4인이 Group member로 참여했습니다. 여기 그룹에 해당하는 연구자들은 한국의 학위논문 심사위원에 해당할, 후술할 Examiner(논문심사위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Viva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3. Confirmation Seminar
Commencement 이후 1년 동안 진행한 연구의 경과를 공개 강의의 형태로 발표하고, 앞으로 2년 동안 남은 기간동안에 할 연구 계획을 발표합니다. 앞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본과 틀을 갖추었는지를 보는 성격이 강합니다. 앞으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어려움 같은 것을 이야기 해 볼 수 있습니다. 연구의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수업 청강을 권유받기도 합니다. Confirmation Seminar는 합격/불합격/유보의 카테고리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합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더 이상 학교에 남을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보건학을 예로 들면, 주로 Literature review의 경과 보고, 그리고 리뷰를 통해 밝혀낸 Research Gap을 바탕으로, 이를 메우기 위하여 앞으로 2년동안 할 연구의 계획을 발표하는 편이며, 또한 앞으로 2년동안 진행할 연구를 위한 Ethics Approval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IRB)의 진행 경과를 보고하기도 합니다. 학술지에 Publication하는 실적을 보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즉, 그 정도의 속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Confirmation Seminar에 탈락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4. Progress Review
2년차 - 3년차 동안 주기적으로 연구 경과를 리뷰받게 되며, 학위 과정 탈락 등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기는 지도교수 그룹이나 커미티 멤버의 결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5. Completion Seminar
통상적으로 박사과정을 시작하고 3년(최대 3년 6개월)이 되면, 그동안 연구를 한 경과를 공개 강의의 형식으로 발표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는 프로토콜이지만, Confirmation Seminar와 달리 학위 취득과 관련하여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해당자리에서 시험을 받는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Completion Seminar의 시점 자체를 Supervisory Group과 상의하면서 잡기 때문에 연구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너무 이른 시점에는 하지 않게 됩니다. 즉, Showcase의 성격이 강합니다.
Completion Seminar는 외부 심사자에게 완성된 논문의 심사(7. Viva)를 받기 위해 논문 제출(6. Submission)의 최대 6개월 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즉, Completion Seminar 이후에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더 있는 것이죠.
Thesis-by-paper 모델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 때까지 학위 논문에 수록할 모든 챕터들이 저널 논문화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3개 sub-chapter를 저널화 하는 것이 목표인 박사과정 연구가 있다면, 1개는 게재, 2개는 리뷰중인 경우도 흔합니다.
6. Submission
논문을 심사할 연구자에게 보낼 완성된 학위 논문의 제출을 의미합니다. 학위 논문의 Submission 기한은 4년 또는 Completion Seminar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입니다. Completion Seminar를 36개월 시점에 하셨다면 42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이때부터 학교의 Stipend지원이 중단됩니다. 일부단과대의 경우 약간의 Top-up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으나, 일반적으로는 학교로부터 지원이 중단되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쯤되면 비자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지라 짧은 유효기간을 가지고 취업을 하기도 쉽지 않고, 보다 긴 유효기간을 갖는 졸업비자를 신청할 때까지는 앞으로 4~6개월 더 남았기 때문에 (6.Submission to 9.Conferra), 돈을 아껴두시거나 학교에서 Casual job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미리미리 만드셔야 합니다. 여담으로, Stipend의 최대 지급 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 6개월(3년 기본 + 6개월 연장)인데, 3년 3개월 차에 Submission을 하게 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3개월치의 Stipend를 포기하는 셈이므로 유불리를 잘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7. Viva (또는 Examination)
2025년부터 멜번대학교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의 Thesis examination 포맷을 Oral로 변경합니다. 2025년에 입학한 박사과정생부터 해당하기 때문에 어떠한 포멧으로 정확하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영국의 Viva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논문을 완성하여 제출하면(Submission), Viva에 참석하는 Examiner(논문심사위원)을 읽고, 지정된 날짜에 Viva를 하는 시스템을 이해됩니다.
8. Post Viva (Examination results)
Thesis examination이 끝나면, Examiner로 부터 받은 수정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 내부에서 수정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고, 학교 도서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Minor Revision인 경우). Major Revison일 경우 Examiner에게 다시 보내어 리뷰를 받게 됩니다.
9. Conferral
논문을 도서관에 최종 제출하면, 주기별로 지정된 날짜에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졸업식과 학위수여일이 일치하는 한국혹은 미국 시스템과 다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Coursework이 없는 호주의 박사 학위과정 시스템 상, 1년 내내 입학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학위 수여일은 1년에 많게는 10여 차례 있으나 졸업식은 2회 뿐이므로, 지정된 학위 수여일 기준으로 박사 학위자가 됩니다.
10. Graduation Ceremony
졸업식은 1년에 2회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경우 Conferral 시점으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본인이 원하는 계절의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M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멜번대학교에서 했던 Casual 업무들 (과 노동계약 유형들) (0) | 2023.07.11 |
|---|---|
| 멜번대학교 대학원 한인 학생회 (Korean Postgraduate Student Association) (0) | 2022.11.22 |
| 호주에서 학회 발표 모두에 하는 호주 원주민에 대한 Acknowledgement 멘트 (0) | 2021.09.24 |
| 자살예방연구를 함께 고민할 연구자를 찾습니다. (0) | 2021.09.18 |
| 호주 (멜번대) 박사과정 형태와 장학금 (7) | 2021.05.24 |